글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 / 김경수 / 필로소픽 / 2024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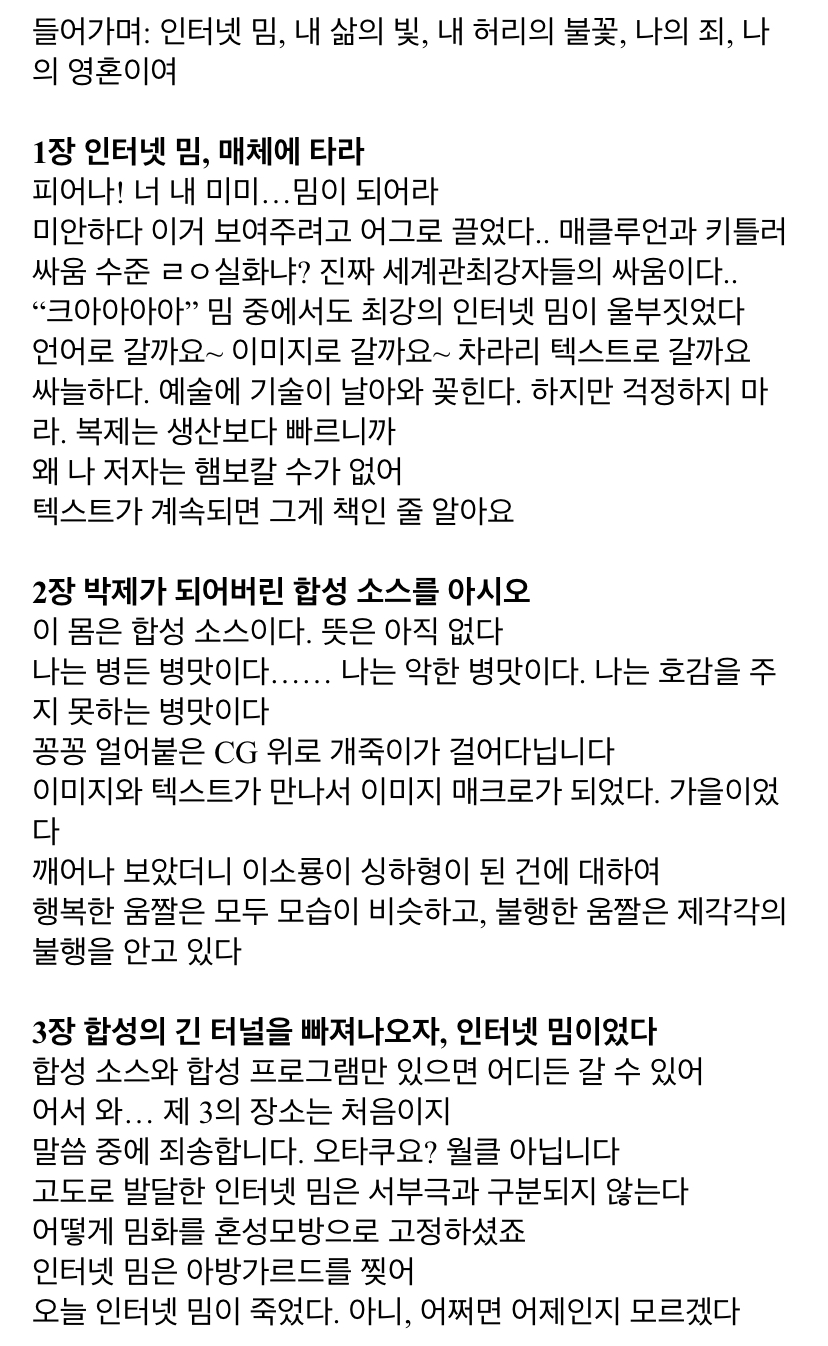

짤방과 드립에 담긴 한국 대중 여론의 흐름, 그리고 그 여론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 사회상에 대해 매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심영물’을 주제로 한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대중서적의 성격에 맞게 보충하여 쓴 책이다. 인터넷 문화 확산 초창기의 ‘아햏햏’ 문화부터 ‘빠삐놈’, 심영물, 각종 인용 유행어(목차에 나온 소제목들을 보면 대충 감이 올 것이다) 등 시대를 풍미했던 주요 인터넷 밈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해당 밈이 인기있던 당시 시대상과의 연관성도 다루었다.
키치함과 B급 감성에서 우러나는 해학과 웃음을 추구하는 인터넷 밈은 갈 곳 잃은 청년 세대의 좌절과 우울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좌절한 청년들을 정치적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퍼뜨려지는 혐오 정서의 파급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매체가 세상을 읽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왜곡하는 프레임이 되기도 하기에, 오늘날 인터넷 밈이 현실사회에 미치는 유해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극성을 재화와 등가교환하는 ‘관심경제’가 대세가 된 지금, 빠르고 뜨거운 반응만을 의도하는 극도로 자극적이기만 한 혐오성 밈이 사회적 상식을 파괴하고 개개인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흉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밈의 존재와 영향력을 마냥 부정하고 터부시할 수만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유머와 풍자로 세태를 비판하는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밈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밈을 소비하고 퍼뜨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사유와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인터넷 극우 콘텐츠발 혐오성 밈의 확산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한번쯤 꼭 읽어볼 만한 책. 여담으로, 서브컬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책 곳곳에서 등장하는 유명 밈 인용 문장에 피식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매체로 인해 우리 삶이 확장되기는커녕 뒤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심연을 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전제가 더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36쪽)
“우리가 즐긴 놀이가 사실은 혐오나 차별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패악질에 불과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인터넷 밈은 현실적으로 깊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도 증발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132쪽)
“그러나 드립을 태생부터 문제적 수사라며 죄악시하고 금지한다면 우리는 인터넷 밈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한다. 오히려 드립과 그에 기반하는 인터넷 밈이 공공적인 놀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중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147쪽)
“전용을 사용한 인터넷 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부조리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수단이 된다.
비판적 사고를 좌파라고 낙인찍고 억압하려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밈의 역할은 중요하다. 비판적 사유를 심되, 그것을 밈이라는 형식에 감출 수 있어서다.
인터넷 밈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비판을 유머로 무마하듯이, 그 반대로 유머를 통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169쪽)
“일부 밈은 성소수자 혐오를 재생산하는 데 일조했고,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을 놀이로 소비하며 극우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터넷 밈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면서 놀이문화로서 인터넷 밈은 사라지고 정치적 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202~203쪽)
“담론의 외주화에 익숙해진 이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생각하며 정치적으로 깨어 있다고 자신하지만, 타인의 정보를 접하면서 자기 안에 타자와 충돌하는 몽타주를 만들어낼 의지가 없다. 그저 주어진 이미지에 자신을 숨기거나, 주어진 이미지를 아무 곳에서나 남발하면서 자기가 할 말만 하기 때문이다.” (216쪽)
“디시에서 비롯된 인터넷 밈이 왜곡된 능력주의와 결탁해 나타난 재미지상주의가, 혐오 발화를 농담으로 치부하고 혐오를 재생산하게 방조했다는 것이다.” (217쪽)
“관종은 좋아요와 댓글을 얻고자 더욱더 자극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약자 혐오와 같이 금기시된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중의 반응을 자아낸다. 드립은 관종이 추천글에 오르려 하는 욕구에 의해서 남발되지만 한편으로는 극우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관종은 또 다른 관종을 낳고, 그들에 의해서 혐오가 확대 재생산된다.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밈화는 타인을 혐오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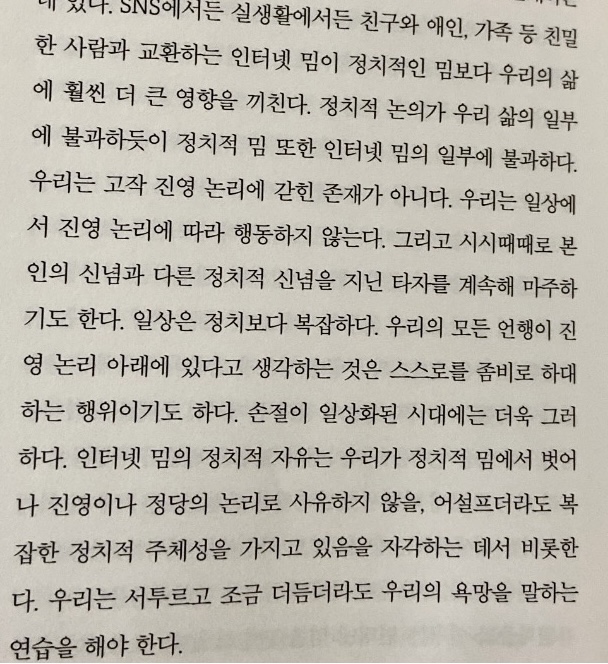
“인터넷 밈이 사유의 부재로 우익에 의해 전유될 것이라는 공포는 가득한데, 왜 반대로 시민 사회가 다 함께 인터넷 밈을 전유할 가능성은 상상하지 않을까?
유머는 타인과 나 사이의 대화이자 미메시스다. 추천 수와 좋아요로 내 자존감과 지갑을 채우려는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웃기겠다는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유머를 이기지 못한다.” (220쪽)
'이 한 권의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0) | 2024.03.23 |
|---|---|
| 처음 엮어진 책에 담긴 그 시대 사람의 마음 (0) | 2024.02.13 |
| 경제학 논문에서 복지국가의 길을 찾다 (1) | 2023.12.18 |
| <어린 왕자>를 전북 방언으로 다시 읽어 보자 (0) | 2023.06.11 |
| 10대, 혹은 그 이상의 모두를 위한 도서관 만들기 (0) | 2022.04.18 |
| 더 좋은 공공도서관을 위해 필요한 것은 (0) | 2022.03.08 |


RECENT COMMENT